저 오래된 여인숙이라는 블로그에 Camel의 전 곡이 올라오길래 링크를 모아 보았다. 그런데 명색이 캐멀의 팬이라고 하면서 남의 블로그를 링크만 옮겨 붙이는 것이 다소 찜찜해 앨범에 대해 (리뷰는 능력이 안 되기에) 짤막한 멘트라도 달아놓을까 싶다. 그래도 정주행 한번 하면서 멘트를 다니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이미지나 볼드 처리된 앨범 타이틀을 클릭하면 전 곡을 들을 수 있는 포스트가 뜬다.
캐멀의 데뷔 앨범으로, 눈물 흘리며 질주하는 낙타 열차(?)를 담은 커버 이미지가 인상적이다. 내 취향상 처음 들을 때에는 캐멀 특유의 서정성이 담긴 Mystic Queen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큰 인상을 남기는 앨범은 아니었다. 하지만 후일 발매된 라이브 앨범 <Never Let Go>를 듣고 난 뒤에는 Never Let Go 같은 그루브감 넘치는 곡도 서서히 관심을 끌게 되었지만 거장의 데뷔 작 정도로 여기기는 마찬가지다.
추천 곡: Mystic Queen, Never Let Go
캐멀 골수 팬들에게 캐멀 하면 대개 이 앨범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다. 나 또한 이 앨범의 이미지를 넷상에서 나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종종 쓰고 있다. 앨범 전체적으로 애잔한 느낌의 서정적인 연주와 함께 그루브 감 넘치는 박력 있는 연주가 종횡하는데,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서 영감을 받은 곡들이 많이 보인다. 이 앨범의 백미이자 절정인 3부작 조곡 Lady Fantasy 역시 갈라드리엘을 노래한다고 한다.
추천 곡: Supertwister, Lady Fantasy
폴 갤리코의 동화 <Snow Goose>를 음악으로 표현한 토털 컨셉 앨범으로, 동화에 대한 사운드 트랙이라 할 수 있다. 캐멀을 동명의 담배 회사 소속 밴드로 오해한 폴 갤리코가 저작권 사용 승인을 해 주지 않아 제목을 저렇게 지어야 했고, 가사도 쓸 수 없었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됭케르크 철수를 역사적 배경으로 한 외톨이와 소녀의 우정 그리고 그 둘을 이어 준 흰기러기의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동화의 주요 사건과 인물을 보컬 없이 연주만으로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다.
추천 곡: Rhayader, Snow Goose
캐멀 서정 미학의 극치라 할 수 있는 앨범이지만, 결성 시부터 이어 온 앤드류 레이티머(V, G, Flute), 피터 바덴즈(K), 앤디 워드(D), 덕 퍼거슨(B)으로 구성된 탄탄한 쿼텟은 이 앨범으로 종결을 맞이한다. 그만큼 이 앨범은 밴드의 최절정이자 화룡점정이 아닐까 한다. Song Within Song, Spirit Of The Water, Air Born, Lunar Sea로 이어지는 곡들은 커버 이미지만큼 아름다우며, 다른 곡에서도 마찬가지로 짠한 멜로디를 느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모든 곡에 애정이 가는 유일한 앨범이다.
추천 곡: Song Within Song, Spirit Of The Water, Air Born, Lunar Sea
<Moonmadness>를 끝으로 탈퇴한 베이시스트 덕 퍼거슨 대신에 캐러번 출신의 리처드 싱클레어와 킹크림슨 출신의 멜 콜린스(Sax.)가 가세하면서 사운드는 좀 더 재지해졌다. 숫제 One Of These Days I'll Get An Early Night는 재즈 밴드의 곡이라 해도 속을 정도. 하지만 Tell Me 같은 곡에서는 여전히 캐멀 특유의 서정성을 내비친다. 이 앨범을 기점으로 캐멀은 분열과 변화의 시기인 중기에 접어든다.
추천 곡: Tell Me, Elke, Raindance
개인적으로 <Single Factor>와 함께 캐멀의 앨범 중에서 가장 정이 안 가는 작품으로 정규 앨범 중에서는 품절로 구입이 힘들었던 <A Nod And A Wink>를 제외하곤 가장 나중에 구입했다. Echoes에서는 재즈 어프로치가 강한 초기 사운드를 느낄 수 있으나, 동명 타이틀 곡을 비롯해 대체로 앨범 전체적인 구성, 특히 보컬 파트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파퓰러한 느낌이 든다. 이러한 변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밴드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피터 바덴즈가 녹음 도중 탈퇴하고 캐러번 출신의 데이빗 싱클레어가 그 자리를 메우면서 이후 캐러멜(캐멀+캐러반)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마지막 수록 곡인 Rainbow's End는 그나마 남은 서정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파퓰러하기는 매한가지다.
추천 곡: Echoes, Rainbow's End
초입부터 연이어 터지는 파퓰러한 두 곡과 베스트 앨범에서 들은 뉴웨이브 스타일의 Remote Romance 덕분에, 아마 라이브로 먼저 들은 Ice가 아니었으면 이 앨범 역시 어정쩡한 팝 앨범으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진지하면서도 실험적인 프로그레시브 열풍이 잦아들고 반대급부로 펑크와 디스코가 대세이던 70년대 후반에 밴드의 생존 방책은 파퓰러한 사운드였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재지한 사운드 변화의 주동자인 싱클레어 들이 퇴장하면서 캐멀은 다시금 짠한 멜로디를 바탕으로 하는 서정성을 여전히 앨범 속에 녹여 내었다. 다만 그것이 앨범의 기조라 하기엔 부족해 보이지만, 다시 돌아온 대곡 Who We Are와 Ice는 현존하는 캐멀의 기초적인 모델로 남는 듯하다.
추천 곡: Eye Of The Storm, Who We Are, Hym To Her, Ice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섬에 고립되었던 일본군 패잔병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두 번째 토털 컨셉 앨범이다. 밴드의 기조가 점차 파퓰러해지는 가운데 토털 컨셉 앨범을 추구했다는 점은 캐멀이 적어도 평범하게 팝 음악을 하지 않는 아티스트적 면모를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보인다. 잇따른 멤버 교체와 다양한 세션 참여 등으로 약간은 산만한 느낌이 들지만, 실화를 소재로 한 토털 컨셉 앨범인 만큼 인물과 상황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극적이면서도 짜임새 있는 연주로 펼쳐지는 수작이다. 개인적으로 캐멀의 곡 중 가장 좋아하는 곡인 Drafted가 수록되었다.
추천 곡: Drafted, Landscape, Lies
마지막 남은 원년 멤버 앤디 워드마저 약물 중독과 손목 부상으로 밴드를 떠나게 된다. 앤드류 레이티머는 그 죽일 놈의 계약 때문에 왕년 멤버 피터 바덴스와 멜 콜린스를 비롯한 내로라하는 세션을 모아 앨범을 내놓는다. 홀로 남은 레이티머를 상징하는 앨범 타이틀과 커버 이미지는 더 이상 레이티머가 밴드의 리더가 아닌 밴드 그 자체임을 의미하는 듯하다. 밴드의 급작스런 변화기에 나온 작품이다 보니, 캐멀 특유의 서정적 분위기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Heores 같은 곡에서는 갑자기 앨런 파슨즈 프로젝트가 연상되며, You Are the One은 이게 캐멀 맞아 하는 소리가 나오는 등 앨범은 전체적으로 다소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덕분에 <Breathless>와 함께 꽤 늦게 사게 되는 앨범이 되었는데, 그나마 마지막을 장식하는 접속곡 A Heart Desire/End Peace가 그래도 캐멀임을 증명해 준다.
추천 곡: Selva, A Heart Desire, End Peace
개인적으로 엠블 시절 블로그 이름을 가져다 쓰기도 했으며, 히트 곡인 Long Goodbye 덕에 우리나라에 캐멀을 알리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앨범이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Ice와 쌍벽을 이루며 캐멀의 서정성을 극대화하는 타이틀 곡 Stationary Traveller로 기억되는 앨범이다. 분단된 도시 베를린을 소재로 한 토털 컨셉 앨범이지만, 전 매니저와의 법정 공방 때문인지 이전의 토털 컨셉 앨범 두 종에 비하면 구성력이 떨어져 '토털'의 느낌은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커버 이미지에서도 보이듯 앨범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 지배하지만 그 톤은 대체로 고르지 못한 편이라 앨범만 놓고 보면 <Mirage>, <Moonmadness>, <Nude>에 미치지 못하는 다소 아쉬운 앨범이다.
추천 곡: Pressure Points, Vopos, Stationary Traveller
이후 법정 공방과 미국 이주, 레코드 사의 냉대로 인한 7년간의 침묵 끝에 앤드류 레이티머가 독자적인 레이블인 Camel Production에서 내놓은 후기 앨범들, <Dust And Dream>(1991), <Harbour of Tears>(1996), <Rajaz>(1999), <A Nod and a Wink>(2002)는 노발리스 님이 포스팅을 하지 않은 관계로 내가 직접 음원을 올려 놓거나 음원 없이 설명해야 할 듯. 그리고 라이브 앨범인 <God Of Light '73-'75>(2000), <A Live Record>(1978), <Never Leg Go>(1993), <Coming Of Age>(1998) 정도는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아무래도 글을 쪼개야 할 듯하다. 그리고 이 참에 컴필레이션을 만들고픈 욕망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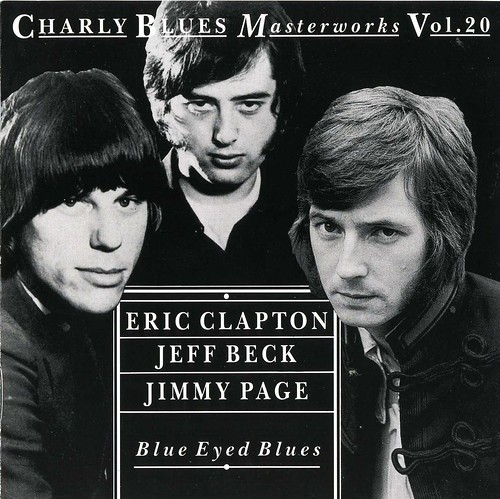

















 의 다른 버전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에게도 흔히 알려진 Without You는 1970년에 나온 <No Dice>에 수록된 곡인데, 이 곡은 Without You의 백미인 후렴구 부분이 원곡(?)과 아예 다르다. 그 덕에 아예 분위기도 통으로 다르다. 배드핑거 버전의 정서가 슬픔 또는 괴로움이라면, 피트 햄 솔로 버전은 안타까움 또는 아련함이다. 원곡(?)의 절절함은 느낄 수 없지만 이것 역시 매력이 있다. 실제로 연인과 이별하면 징징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저 홀로 쓸쓸해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이 곡은 후자의 정서를 반영한 게 아닐까?
의 다른 버전이 수록되어 있다. 우리에게도 흔히 알려진 Without You는 1970년에 나온 <No Dice>에 수록된 곡인데, 이 곡은 Without You의 백미인 후렴구 부분이 원곡(?)과 아예 다르다. 그 덕에 아예 분위기도 통으로 다르다. 배드핑거 버전의 정서가 슬픔 또는 괴로움이라면, 피트 햄 솔로 버전은 안타까움 또는 아련함이다. 원곡(?)의 절절함은 느낄 수 없지만 이것 역시 매력이 있다. 실제로 연인과 이별하면 징징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저 홀로 쓸쓸해하는 척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이 곡은 후자의 정서를 반영한 게 아닐까?


